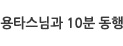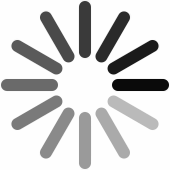명상컬럼
- 제목
- 115. 그럼 나는 뭐지? 뭐지?
- 작성자
- 관리자
- 파일
<그럼 나는 뭐지? 뭐지?>
두 아이의 엄마로 정신없이 직장에 다니면서 문득 “내 시간 좀 있었으면” 하던 때가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며느리나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비서도 아닌, ‘순수한 나’를 위한 시간. 그러나 그 ‘순수한 나’란 과연 무엇인지 깊게 따져보지도 않았다. 뒷날 어느 법문 자리에서 ‘나는 무엇무엇이다’ 하고 적어보라는 말을 들었다.
‘나’가 무엇이냐고? 우선 이름, 주소, 가족관계 따위, 가장 흔한 신분 표시를 주섬주섬 생각해 보았다. 내 이름은 유 아무개.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정 아무개의 처. 큰놈과 작은놈의 모. 이렇게 해놓고 보니 나는 유씨네 딸로 정씨네 며느리이고 아무개의 마누라고 아이들의 어미일 뿐 절대 ‘순수한 나’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의 경력을 들먹거려 보았다. 무슨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할 줄 알며…. 그런데 이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경력이란 모조리 관계, 관계의 덩어리였다. 아이고, 나를 가르치신 선생님들만 해도 도대체 몇 분이신고. 직장에서 밉고 예쁘던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는고. 그리고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을 부축해 주던 사람들, 문구점 주인에서부터 버스 기사에 이르기 그 무수한 사람들. ‘순수한 나’를 가려내려고 기를 쓰면 쓸수록 이 ‘나’를 둘러싼 관계망들은 더더욱 촘촘해져가기만 한다. ‘순수한 나’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불교책을 읽어댔다. 맹구우목(盲龜遇木)의 인연으로 동사섭을 만나 ‘비아(非我) 명상’이란 공부를 하며 ‘나’를 본격적으로 따져들어 갔다.
“자, 여러분들, 보통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나’인지 따져봅시다. 우선 나를 둘러싼 환경부터 시작해서 여섯 단계로 따져 보는데 그러는 중에 아, 이건 정말 나야 하는 것을 만나면 잡아보세요.” 그 안내에 따라 ‘나’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다. “자, 환경은 내가 아닌 것이 확실하지요? 그럼 환경을 치우세요.” 환경을 내가 아니라고 치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다음은 몸이다. “몸은 어떠세요? 몸. 이 몸이 나일까요?” 그 몸은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안내에 따라 그것도 멋지게 치워버렸다. “이 몸은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만난 수정난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정자가 나인가? 어머니 난자가 나인가?” 그 물음 앞에선 어쩔 수 없이 “아니오.” 할 밖에 없었다. 그 수정난이 어머니 배 속에서 커가다가 열 달만에 세상에 나왔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자연이 만든 그 무엇이지 ‘나’가 아니었다. 그 자연물에 ‘나’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아무래도 제멋대로로 여겨졌다.
다음은 마음이다. 마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쌀쌀맞게 굴 때면 톡 뱉어내는 “내 마음이야.”하는 그 마음이다. 마음이 무얼까? 마음이라는 말이 언제나 두루뭉실하게 느껴졌는데 그 마음이란 수상행식이란다.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를 행하고, 의식하는 것이 마음이라 정리되니 개운했다. 그런데 몸 속 어딘가에 있는 이 작용을 ‘나’라고 할 수 있는지 아리송하다. 이런 물음들 앞에 서기 전에는 이 ‘나’라는 것은 정말로 확실한 형체를 지니고 불처럼 환하게 느껴졌는데 그 ‘나’가 점점 애매하고 모호해진다. “마음이 ‘나’가 아니라면 그 마음도 치워라.” 환경도, 몸도, 마음도‘나’가 아니라고 치워버리니 무언가 점점 비어져가는 느낌이다.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식주체를 따져본다. “몸은 ‘나’가 아니다, 마음은 ‘나’가 아니다 하는 그 놈,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놈, 그것이 식주체다. 그 식주체가 ‘나’인가. 식주체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기능이 ‘나’인가?” 그런데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식주체기능은 ‘나’가 아니다.” 하고 그것마저 치워버리려는 찰나, 지금까지 점점 기가 죽어가던 그 ‘나’가 꼿꼿한 고개로 벌떡 일어서며 “그럼 나는 뭐지? 뭐지?” 하고 달려든다. 그 반격에 흠짓 놀랐으나 이내 “식주체 기능은 식주체기능일 뿐 ‘나’가 아니다.”하고 손사레를 쳐본다. ‘나’가 다시 미친 듯이 외친다. 그럼 나는 뭐지? 뭐지? 뭐지? 이제 이것에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다. “나란 없다.”
이것이었다! 정답은 이것이었다. 나란 없었다! 그 정답과 함께 가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며 시원해졌다. 60 년을, 아니 세세생생 세상의 어떤 금속보다 날카롭고 견고하게 자리하며 호령하던 그것이 “없어.”하는 그 한 마디에 망령이라는 정체가 발각되어 그만 힘없이 사라진 것이었다.가슴이 시원하고 시원하다. 그 까탈스럽고 변덕스런 ‘나’, 이기심이라는 중무장으로 유지하고 지키고 방어해야 하는 그 ‘나’라는 짐에서 벗어난 그 시원함!
그것이 없어지고 나자 그 다음은 일사천리이다. 식주체 기능의 본바탕이라 할 수 있는 의식 자체를 따져본다. 이 순수의식이 나인가. 이 의식.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저 홀로 독립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의식도 의식되려면 식주체 기능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몸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줄줄이다. 순수의식 또한 연기물이다. 실체가 아니니 ‘나’라고 잡을 것이 없다. 순수의식은 ‘나’가 아니다. 그것을 제친다. 그래도 순수의식은 여전히 그 자리에 현전한다. 제치면 더더 순수해질 뿐. 그 끝없는 더더…를 잠시 멈추고 세상을 둘러본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끝내 없으나 마치 있는 것처럼 세상을 위해 역할을 하는 ‘나’라는 이름의 순수의식. 이것이 묘유이다. 마지막으로 “묘유는 ‘나’가 아니다.”하며 손사레를 친다. 번뇌와 갈등으로 혼란스럽던 ‘나’가 터져서 사라지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보살이 탄생되는 순간이다.
이 세상에 ‘나’라는 실체는 없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모든 관계망에서 빠져나와 100% 단일한 순수성분으로 꾸며진 존재란 있을 수 없다. 이 세계 자체가 중중 연기의 산물인데 어디에 홀로 존재하는 외로운 실체가 있으랴. 그러면 도대체 그토록 오랫동안 ‘나’라고 생각해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애매한 사고와 게으른 습관의 산물이었다. 조금만 따져 보아도 이 ‘나’ 라는 것이 허구임이 금방 드러나지만 애매한 사고에서 생겨난 ‘나 있음’ 이라는 습관은 구르면 구를수록 힘이 더 커지는 법. 그 힘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명상이다. 명(瞑), 조용한 상태로, 상(想), 사유해보는 것. 오늘도 수행점검표 비아 명상 란에 동그라미를 친다.
글. 선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