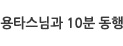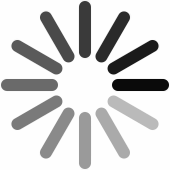명상컬럼
- 제목
- 125. 명사(名辭)에 대한 약간의 성찰
- 작성자
- 관리자
- 파일
사전에서 명사(名辭)를 찾아보니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엔 그 이름씨가 몇 개나 있을까? 우선 내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것들의 이름부터 헤아려 본다. 컴퓨터, 모니터, 마우스, 물컵, 안경, 수첩, 연필, 핸드폰, 시계, 꽃병, 달력, 손수건, 휴지, 과자, 햇빛, 그림자, 아니, 그것만이 아니다. 조금 자세히 살피니 먼지가 꽤 있고(이런!) 무당벌레도 있다. 세수수건 넉 장 크기의 책상 위에 널려져 있는 것들이 이렇다면 천하의 이름들은 그 얼마나 많을까? 바람 속에 일어나는 흙먼지 알갱이보다 많을 것 같다. 지금도 지구촌 도처에서 새로운 사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이렇게 사물의 이름을 들먹이는 까닭은 그 이름이란 것이 우리 속에 근심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컵이 하나 있다 하면 우리 사람은 그냥 있지 못하고 즉시 그 컵에 가지가지 형용사와 복잡한 소유격을 붙인다. 그리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갖가지 사연을 만들어내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천 명, 만 명, 때로는 국민 전부, 지구인 전체가 들러붙어 시끌벅적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 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고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다. 글쎄, 하늘의 잔별과 사람 가슴 속 수심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아무래도 사람 가슴 속 수심이 청천 하늘의 잔별을 능가하지 싶다. 하늘의 잔별 하나는 그냥 그것 하나로 그치는데 사람이 지어 놓은 이름은 그 앞에 붙는 형용사와 소유격의 종류에 따라 하나가 열 개, 스무 개로 번식하는데다가 여기에 동사까지 합세되면 이름씨 하나가 얼마든지 몇 백 개, 몇 천 개의 번뇌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책상 위에 안경이 있다. 이 안경은 지구의 뱃속에 처음부터 안경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혜가 발달하여 꽤돌이가 된 인간이 이 궁리 저 궁리 끝에 렌즈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것에 걸개를 붙여서 인간의 코와 귀를 이용하여 두 눈 앞에 세울 수 있게 만든 도구이다. 안경을 안경 모양으로 조립해 낸 것은 분명 인간의 공로이긴 하나 그 안경이라는 물질을 있게 한 모든 선행 조건과 원인들을 따져 보자면 안경은 우주 전부가 동원되어 만들어낸 우주의 자식임을 알게 된다. 우선 그 안경을 조립해낸 인간 자신이 우주의 작품이지 않은가 말이다. 어디 안경뿐인가. 연필이 그러하고 시계가 그러하고 무당벌레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 내 책상 위에 즐비하게 늘어선 그것들은 모조리 우주, 우주, 우주, 우주일 뿐이다. 우리의 물리적 시력은 그저 달랑 한 개의 컵, 한 개의 수첩, 한 마리의 무당벌레만을 볼 뿐이지만 그 하나하나 개별자들은 모두 너나 없이 그 뒤에 우주 전부가 따라 붙어 있는 것이다.
명사가 번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까닭은 전 우주가 동원되어 탄생하고 끝없이 변화해가는 것들이 어떤 고정된 이름을 얻어 명사화되면 일정한 테두리 속에 한정되고 전체와 단절된 유한한 개별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게 연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을 연필과 연필 아닌 것으로 갈라치는 행위이다. 어떤 사물이 연필이라고 명명되는 순간 그것은 필통이 아니고, 책상이 아니고, 컵이 아니고, 안경이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천하의 그 어떤 사물도 아니고 오로지 연필로만 고정된다. 우주 그 자체로 무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그 가능성과 전체성을 빼앗기고, 먼지만도 못한 연필이라는 울타리 속에 영원히 박제되는 것이다. 사전에 보니 연필은 “필기 용구의 한 가지”라고 정의되어 있다. 연필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사물은 ‘필기 용구의 한 가지’라는 감옥 속에서 종신형을 살다가 사라져야 하는 수형수가 된 것이다. 본래 이 세계에는 명사라는 것이 없다. 구태여 있다고 한다면 한 덩이의 연기적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동적인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명사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곧 우주 그 자체임을 깨달으면 된다. 그것을 모르면 이 세계는 비극적인 수형수의 세계가 되고 말지만 그 사실을 이해하면 이 세계는 축복받은 불보살의 세계가 된다.
연필은 우주 자체이다. 그런데 연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까닭은 그것의 본질이 연필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의 역할이 연필이기 때문이다. 내 책상위의 모든 것들, 컵은 그 본질이 컵이 아니고 그 역할이 컵이다. 안경은 그 본질이 안경이 아니라 그 역할이 안경이다. 시계, 컴퓨터, 꽃병, 햇빛… 이것들은 그 역할이 시계이고 컴퓨터이고 꽃병이고 햇빛이다. 그 본질은 모두 무한 가능성의 우주이되 자기에게 인연된 이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이들은 모두 보살이다. 하나하나 모두 무한 그 자체이되 이 세상을 위해 맡은바 역할을 하고 있는 보살들. 물컵 보살, 시계 보살, 컴퓨터 보살, 꽃병 보살, 햇빛 보살, 그림자 보살, 무당벌레 보살…. 그이들은 참으로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아무 상(相)없이 보살행을 하고 있다. 중중 연기의 우리 세계. 이 세계는 그렇게 보살들의 세계인 것이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보살들의 세계인 것이다.
글. 선혜님